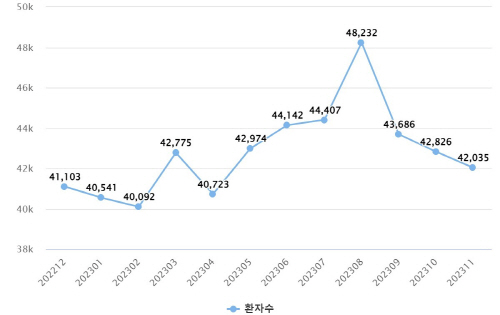과도한 햇빛 노출에 비타민D 생산 늘어 칼슘 흡수 증가
통풍 환자 20% 신장결석 발견…그 중 80% 요산결석
|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흐른다. 하지만 체내 칼슘 흡수 증가나 수분 부족 등으로 돌이 생겨 소변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로결석이다. 흔한 증상으로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다. 이외에도 오심이나 구토를 동반하거나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 방치 시 감염이나 신기능 저하도 일어난다.
요로결석 발생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식이 습관, 생활 습관, 수술 병력, 요로 감염 등이 꼽힌다. 수분 섭취 자체가 적은 사람이나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여름에 요로결석이 많이 발생한다. 요로결석 증가는 △부적절한 체액 섭취 △과도한 발한 △탈수 및 농축 소변의 후속 형성 과정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수 이대비뇨기병원 요로결석클리닉 교수(비뇨의학과)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변 양이 줄어들고 소변의 농도가 짙어져서 요로결석 형성이 촉진된다"며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비타민D 생산이 늘어 장에서 칼슘 흡수가 잘되는데 여름철 요로결석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말했다.
|
소변이 시원치 않은 배뇨증상은 결석이 신장에서 방광 가까이로 자연 이동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쪽 옆구리 통증이나 육안적 혈뇨가 보인다면 요로결석일 가능성은 더 커진다. 최정혁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배뇨 증상만으로 요로결석을 의심하긴 어렵지만 옆구리 통증과 혈뇨까지 보인다면 요로결석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요로결석은 무증상인 경우도 가끔 발생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요로결석을 의심케 하는 배뇨증상 중 하나로 소변을 자주 참으면 더 잘 걸린다는 속설이다. 최 교수는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은 소변을 자주 참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배뇨에 문제가 있어 소변 보는 게 수월하지 않은 중장년 남성의 경우는 방광결석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풍 환자라면 요로결석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풍 환자의 약 20%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되고 그 중 80%가 요산결석이라는 연구도 있다. 통풍 환자의 혈중 요산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연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결석이 자주 발생하는 통풍 환자는 통풍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서 소변의 산성도를 낮추는 약제도 복용할 필요가 있다.
요로결석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우선이다. 여름철에는 하루 2L 이상의 수분을 섭취, 결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로결석은 초기 치료 후 5년 이내 최대 50%까지 재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선 적절한 식이요법과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